앨범 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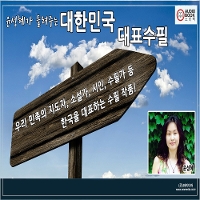
- 윤성혜가 들려주는 한국대표수필
- 윤성혜
- 앨범 평점 0/ 0명
- 발매일 : 2019.07.31
- 발매사 : (주)다날엔터테인먼트
- 기획사 : 와미디어
'윤성혜' [윤성혜가 들려주는 한국대표수필]
윤성혜가 들려주는 한국대표수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소설가, 시인, 수필가, 국문학자, 종교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 작품을 집대성!
[저자소개]
최현배
1894년(고종 31) 10월 19일 ~ 1970년 3월 23일
호는 외솔. 경상남도 울산출신.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뒤 고향의 일신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1910년 상경하여 한성고등학교(漢城高等學校 : 뒤에 경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됨.)에 입학하여 1915년 졸업하였다.
그 해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문과에 입학하여 1919년 졸업하고, 1922년 4월에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 교육학을 전공하여 [페스탈로치의 교육학설]이라는 논문으로 1925년 졸업, 계속하여 그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서정주
호는 미당(未堂). 전북 고창 태생. 소년 시절에 한학을 배우다가 중앙고보와 고창고보에서 수학하였다.
서정주의 초기 시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 악마적이며 원색적인 시풍을 보여주지만,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운명적 업고(業苦)에 대한 인식은 영겁의 생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진건
호는 빙허(憑虛). 1900년 8월 9일(음력) 대구 출생.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1912년 일본의 세이조중학(成城中學)에 입학하여 1917년에 졸업하였다.
데뷔작인 『소낙비』를 비롯하여 대부분 농촌을 무대로 한 작품을 많이 남긴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이다. 노다지를 찾으려고 콩밭을 파헤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그린『금 따는 콩밭』, 머슴인 데릴사위와 장인 사이의 희극적인 갈등을 소박하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봄봄』등 한국의 옛 농촌 정서를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풀어내 그만의 문학세계를 그려나갔다. 그 밖에 『동백꽃』, 『따라지』 등 다수의 단편이 있다.
김진섭
1903 ~ 미상. 호는 청천(聽川). 전남 목포 출생. 1920년 양정고보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에 건너가 1927년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독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유학 시절 손우성(孫宇聲)‧이하윤(異河潤)‧정인섭(鄭寅燮) 등과 함께 해외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해외문학』을 창간하기도 했다. 여기에 평론 「표현주의 문학론」과 독일 하인리히 만의 소설 「문전(門前)의 일보(一步)」와 K. F. 메이야의 시 「모든 것은 유희였다」 등을 번역하는 등 순수시 옹호운동과 해외문학 소개 활동을 했다. 1931년 7월에는 윤백남(尹白南)‧홍해성(洪海星)‧유치진(柳致眞)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여 외국 근대극을 번역‧상연함으로써 신극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생활의 예지와 인생의 사색, 철학을 담은 중후한 수필을 본격적으로 창작하였다.
지하련
1912.7.11 ~ 미상. 본명 이현욱. 1912년 7월 11일 경남 거창 태생. 일본 쇼와여고를 졸업했다. 1935년 카프 해산을 전후하여 당대 카프의 지도자였던 임화와 결혼하여 주목을 끌었다. 1940년 소설 「결별」이 백철의 추천으로 『문장』에 발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이 작품은 백철이 추천사에서 「결별」 한 작품으로도 능히 당대 문단수준을 육박하고 넘칠 것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이 작품은 참신하고도 능숙한 솜씨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복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1947년 임화와 함께 월북할 때까지 중요 작가로 활동하였다. 광복 직후 남편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였고, 역시 임화와 함께 월북하였다. 임화는 1953년 8월 미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된 바, 그 후 지하련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병주
현대사의 이면을 파헤쳐온 '한국의 발자크' 소설가 이병주는 1921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였다.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와 와세다대학 불문과에서 수학했으며, 진주농과대학과 해인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 『국제신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냈다. 마흔네 살 늦깎이로 작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92년 타계하기까지 27년 동안 한 달 평균 1만여 매를 써내는 초인적인 집필활동으로 80여 권의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염상섭
서울출생. 보성소학교를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문학부에서 수학하였다. 1919년 10월에 「암야」의 초고를 작성하고 『삼광』에 작품을 기고하는 등 20대 초반부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1920년 2월 『동앙일보』 창간과 함께 진학문(秦學文)의 추천으로 정경부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1920년 7월 김억(金億), 김찬영(金瓚永), 민태원(閔泰瑗), 남궁벽(南宮璧), 오상순(吳相淳), 황석우(黃錫禹) 등과 함께 동인지 『폐허』를 창간하고 폐허 창간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완서
경기도 개풍 태생. 서울대 국문과를 중퇴했다. 1970년 장편소설 「나목」이 『여성동아』현상모집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초기 작품에서부터 중산층의 생활양식에 대한 비판과 풍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의 흉년」(1977), 「휘청거리는 오후」(1977), 「목마른 계절」(1978) 등의 장편소설에서 중산층의 가정을 무대로 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매우 폭이 넓다 사회적 단위 집단으로서의 가족구성의 원리와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그녀는 가족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역사적인 사회변동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현실의 삶을 실재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그려냄으로써, 한국사회의 내면적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무엇이 삶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파헤친다.
김태길
수필가 · 철학자. 충북 중원군(中原郡) 이류면(利柳面) 두정리(豆井里) 출생. 호는 우송(牛松). 1943년 일본 제삼고등학교(第三高等學校) 문과(文科)를 거쳐 동경대학(東京大學) 법학부(法學部) 수학. 해방후 서울대학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동 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1960년 미국 존즈 홉킨즈 대학원을 졸업,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연세대학과 서울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61년 처녀 수필집 [웃는 갈대]를 발간, 이어 [빛이 그리운 생각들](65), [검은 마음 흰 마음](68), 장편수필 [흐르지 않는 세월(歲月)](73)을 내놓았다. 이밖의 저서로 [한국인과 문학사상(文學思想)](共著)이 있다. 주목받은 논문으로 [이조소설(李朝小說)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價値觀) 연구]가 있다.
신채호
본관 고령(高靈). 필명 금협산인(錦頰山人)·무애생(無涯生). 호 단재·일편단생·단생. 1880년 12월 8일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익동 도림리(현재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신광식(申光植)이며 모친은 밀양박씨이다. 할아버지 신성우(申星雨)로 부터 한학을 익혔고, 1897년 신기선(申箕善)의 추천으로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 이남규(李南珪)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그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황성신문(皇城新聞)]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듬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주필로 활약했으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앙양에 힘썼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사학자·언론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앙양에 힘썼다.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백신애
여류소설가. 경상북도 영천(永川) 출생. 본명은 무잠(武岑). 어려서는 한문과 여학교 강의록으로 공부하였고,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원에 이어 자인공립보통학교(兹仁公立普通學校) 교원으로 근무하다 사임하고,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 여자청년동맹(女子青年同盟) 등에 가입하여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다. 1929년 [조선일보] 에 박계화(朴啓華)라는 필명으로 [나의 어머니]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했다. 이듬해에 도일, 니혼대학(日本大學) 예술과에 다니다가 1932년 귀국한 뒤 결혼했으나, 이내 이혼하였다. 1933년경부터 창작에 전념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조지훈
경상북도 영양(英陽) 출생으로 엄격한 가풍 속에서 한학을 배우고 독학으로 중학과정을 마쳤다. 1941년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오대산 월정사 불교강원의 외전강사를 역임하였고 조선어학회 [큰사전]편찬에도 참여했다. 1939년 [고풍의상](古風衣裳), [승무](僧舞), 1940년 [봉황수](鳳凰愁)로 [문장](文章)지의 추천을 받아 시단에 데뷔했다.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하여 우아하고 섬세하게 민족정서를 노래한 시풍으로 기대를 모았고,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1946년 [청록집](靑鹿集)을 간행하여 ‘청록파’라 불렸다. 1948년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4·19와 5·16을 계기로 현실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집 [역사(歷史) 앞에서]와 유명한 [지조론](志操論)을 썼다. 1963년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에 취임하여 [한국문화사서설](韓國文化史序說), [한국민족운동사](韓國民族運動史) 등의 논저를 남겼다.
한용운
저자 한용운 (1879~1944)은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 호는 만해, 법호는 용문이다. 한학을 배우며 자란 그는 18세에 의병이 되어 동학 혁명에 가담하나 실패로 돌아가자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시베리아로 건너갔다가 3년 뒤 귀국해 [불교대전]을 저술하여 불교의 현실참여를 유도하였다. 시작(詩作) 활동은 1918년 [유심]을 발간하면서 발표하기 시작했고 26년에는 [님의 침묵]이 출간되었다. 3·1운동때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어서에 서명했으며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에 힘을 기울이며 각종 저술활동을 계속하다가 44년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시집 [님의 침묵]외에 [조선불교유신론], [십현담주해], [정선강의채근담] 등이 있다.
채만식
호는 백릉(白菱), 채옹(采翁). 1902년 6월 17일 전북 옥구군 임피면 읍내리에서 채규섭(蔡奎燮)의 5남으로 출생.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예과에서 수학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향리에 머무르기도 했다. 1929년 말부터 개벽사에 입사하여 잡지 『별건곤』, 『혜성』, 『제일선』 등의 편집을 맡았다. 이후 『조선일보』로 잠시 옮겼다가 사직하고, 1936년부터 전업작가로 활약했다. 1924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단편 「세 길로」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최남선
본관 동주(東州:鐵原), 호 육당(六堂), 자 공륙(公六), 아명 창흥(昌興), 세례명 베드로이다. 자습으로 한글을 깨쳐 1901년(광무 5)부터 [황성신문]에 투고했고 이듬해 경성학당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배웠다. 1904년 황실유학생으로 소년반장(少年班長)이 되어, 도쿄[東京]부립중학에 입학했으나 3개월 만에 귀국했다. 190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早稻田]대학 지리역사학과에 들어가 유학생회보 [대한흥학회보(大韓興學會報)]를 편집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시와 시조를 발표했다.
한국의 사학자·문인. 잡지 [소년]을 창간,[해에게서 소년에게] 를 발표했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중 하나이다.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민족대표 48인 중 하나였지만, 이어 친일 활동을 하였다.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였다.
최서해
본명은 학송(鶴松)이고, 호는 서해(曙海)이다. 함경북도 성진(城津)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각지로 전전하며 품팔이·나무장수·두부장수 등 밑바닥 생활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이러한 체험이 그의 문학의 바탕을 이루었다. 1924년 단편 [고국(故國)]이 [조선문단(朝鮮文壇)]지에 추천되면서 문단에 데뷔, 계속 [탈출기(脫出記)] [기아와 살육(殺戮)] 을 발표하면서 신경향파문학(新傾向派文學)의 기수로서 각광을 받았다. 특히 [탈출기]는 살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부부와 노모, 세 식구의 눈물겨운 참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그의 작품은 모두가 빈곤의 참상과 체험을 토대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 간결하고 직선적인 문체에 힘입어 한층 더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예술적인 형상화가 미흡했던 탓으로 초기의 인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불우한 생을 살다가 일찍 죽었다.
김춘수
시인. 경남 충무(忠武) 출생.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예술과 중퇴. 마산대학(馬山大學) · 경북대학(慶北大學) 교수를 역임했다. 1949년 시 [산악(山嶽)]을 [백민(白民)]에, 시 [사(蛇)]를 [문예(文藝)]에 발표하였으며, 주로 [문학예술(文學藝術)] · [현대문학(現代文學)] · [사상계(思想界)] · [현대시학(現代詩學)] 등에서 창작과 평론 활동을 전개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특이하여 그에게 있어선 모든 것이 사물(事物)로 비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식(認識)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이고, 그의 언어는 인식을 위한 연장이다. 그는 인식의 시인이다. 초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벌여 온 작업의 전과정(全過程)에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의 경우를 빼고는 인식이 아닌 때가 없다. 거기서만은 이례적(異例的)으로 그는 의미의 시인이다. [타령조(打令調)]에서도 그의 언어는 상당히 의미의 전달을 담당하는 듯이 보인다.
나희덕
나희덕(羅喜德, 1966년~)은 대한민국의 시인이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2001년~)로 재직 중이다.